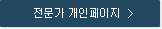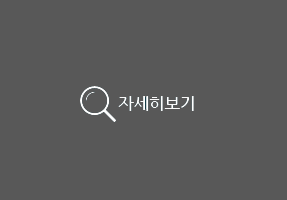[투자자산운용사 전문칼럼]
정말 돈되는 경제민주화
.jpg)
.jpg)
“뭐, 경제민주화?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답답해 하던 지인이 회사 임원과의 소통워크샾에서 언젠가 얼핏 들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그같은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 뒤로 그 직원은 회사 임원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음은 물론이다.
사실 주변 기업가들이나 나름 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기업이 살아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경제민주화란 ‘진보’니 ‘민주’니 하는 사람들의 정치이데올로기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는 동안 우리 사회의 계층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소비위축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경제불안현상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우리처럼 좌우대립이 극에 달한 나라에서 ‘민주’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그 참 뜻이 채 이해되기도 전에 소위 ‘진영논리’에 휩싸이면서 특정 색깔로 덧입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민주화 보다 훨씬 더 쉽고 실감나는 표현은 여럿 있다. 예를들어, 윗물이 차서 넘치면 자연히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을 표현한 ‘낙수효과’가 그 대표적이다. 즉, 기업이 돈을 벌면 투자나 급여인상 등을 통해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고, 그로인해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것저것 소비를 하게되면서 다시 기업의 이익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경제이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과연 기업이 아래로 흘러보낼만한 물이 있느냐에 모아진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얼어붙어있다는 때에 말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완전 상반된 그래표를 가져와 보았다.
.jpg)
<그림 1> 가계소득/국민총소득 비율 (출처 : 한국은행)
위 그래표는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의 15년 동안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나라경제가 파탄났던 IMF직후인 1998년부터 해가 갈수록 떨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들은 물론 OECD평균과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이제 다른 그래표를 같이 보자.
.jpg)
<그림 2> 기업소득/국민총소득 비율 (출처: 한국은행 2013)
위 그래표는 같은 기간 기업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한 비율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가계소득과 달리 기업소득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왔으며 다른 나라들은 물론 OECD평균보다 유별나게 높다.
그래도 이건 2011년까지의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최근 우리나라 20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기업이익을 쓰지않고 쌓아둔 금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말 322조 원이었던 사내유보금은 불과 5년 후인 2013년 말 무려 2배 가까운 588조 원으로 늘어났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376조 원이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그 엄청난 규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반면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축율은 ‘0(제로)’ 상태에 이르렀다.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시장이 얼어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경제민주화는 색깔로 뒤덮인 정치언어도 아니거니와 그닥 어려운 말도 아니다. 그것을 투박하면서도 정겨운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말이다.
“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인자 우리도 좀 같이 묵자~”
- 추천 전문가 컨텐츠
-
-
 [취업전문칼럼] Z 세대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5가지Z 세대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5가지Z세대를 위한 채용 전략이 바꿔야 한다. 핵심 어젠다는 정신 건강...윤영돈 컨설턴트
[취업전문칼럼] Z 세대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5가지Z 세대를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5가지Z세대를 위한 채용 전략이 바꿔야 한다. 핵심 어젠다는 정신 건강...윤영돈 컨설턴트 -
 [취업전문칼럼] 리모트 워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리모트 워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윤영돈 컨설턴트
[취업전문칼럼] 리모트 워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리모트 워크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윤영돈 컨설턴트 -
 [취업컨설턴트 전문칼럼] 화상 면접 대비 주의점 10가지화상 면접 대비 주의점 10가지요즘은 ‘언택트 채용(Untact Hiring)’이 대세가 되고 있다. 신종 ...윤영돈 컨설턴트
[취업컨설턴트 전문칼럼] 화상 면접 대비 주의점 10가지화상 면접 대비 주의점 10가지요즘은 ‘언택트 채용(Untact Hiring)’이 대세가 되고 있다. 신종 ...윤영돈 컨설턴트 -
 [취업컨설턴트 전문칼럼]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 5가지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 5가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은 언택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윤영돈 컨설턴트
[취업컨설턴트 전문칼럼]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 5가지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 5가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은 언택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윤영돈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