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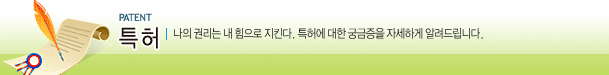 |
|
|
 신지식
재산권 신지식
재산권 |
 |
|
|
|
|
|
|
|
 |
반도체 |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던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등장으로 그 미비점을 노출시켰다. 가령,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지식재산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의 공백 혹은 중복이 생기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기존의 제도에 편입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지도, 차트, 책 등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적용하였으나, Borland 판결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작권법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의 경우도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공통적인 특징을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개념 개념 |
| |
반도체라 함은 전기를 통하는 도체(導體)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부도체(不導體)의 중간에 해당하는 성질의 고체물질을 말하며,
순수한 상태에서는 부도체에 가까운 성질을 나타내나 적당한 양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열·자기(磁氣)등의 자극에 의하여 전기를 통하게 되어 전류의
정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물질로서, 실리콘(Si),
게르마늄(Ge)등과 같은 단원소로 된 반도체와 갈륨비소(GaAs)등과 같은
화합물로 된 반도체로 구별된다.
이러한 반도체 기판(보통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 위에 수천개 내지 수백만개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등의 회로소자를 형성하고, 이들을 도선(導線)으로
연결하여 신호의 정류·증폭·검파·스위칭·기억·신호처리 및 논리연산 등 다양한
전자회로의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이 반도체집적회로, 즉 반도체칩(semiconductor
chip)이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라 함은 위에서 말한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서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64MD램 메모리 반도체칩을 제조할 경우
손톱정도 크기의 반도체기판 위에 6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4백만개의
콘덴서를 내장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서브마이크론(머리카락 굵기의 1/1200)의
미세한 도선을 공간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면 축구장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의 특수한 설계도이며,
이러한 배치설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분야이다. |
 보호
방안 보호
방안 |
| |
 특허법을
통한 보호 특허법을
통한 보호 |
| |
|
특허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도체 배치설계
역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허의 일반적 요건은 ㉠발명의 성립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이다. 그러나 반도체 배치설계는 종래의 특허분야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미 확립된 종류의 집적회로인 경우에는 기술사상이라는
견지에서 공지기술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어서 진보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해서 기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경우 이론설계상의
연구, 레이아웃상의 연구 등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술적 향상이 도모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이
보편화되어 있는 반도체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에 적절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
| |
 특별법을
통한 보호 특별법을
통한 보호 |
| |
|
1979년부터 미국에서 논의되어 오던 반도체칩의 보호문제가 1984년
11월 특별입법인 반도체칩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으로 성립하고 외국인의 반도체 배치설계가 미국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의 법제가 미국과 동등하게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1985년 3월 반도체칩보호법을
제정하고 스웨덴도 보호입법을 제정하였다. 또 EC이사회가 EC가맹국에 대하여
1987년 11월까지 반도체 칩 보호법제를 발효시킬 것을 의무로 하는 이사회지령을
내렸다. 이를 받아들인 EC가맹국은 점차적으로 보호입법을 제정하고 있다.
마침내 WIPO에서도 1989년 5월 26일에 워싱턴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보호조약(Treaty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을
성립시켰다.
그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일랜드·호주·스페인·이탈리아·룩셈브르크·포르트칼·캐나다·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가
보호입법을 제정하였고, 이중에 아일랜드·오스트리아·벨기에·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의 내용은 각국이 거의 동일하다.
|
|
|
|
|
|
|
|